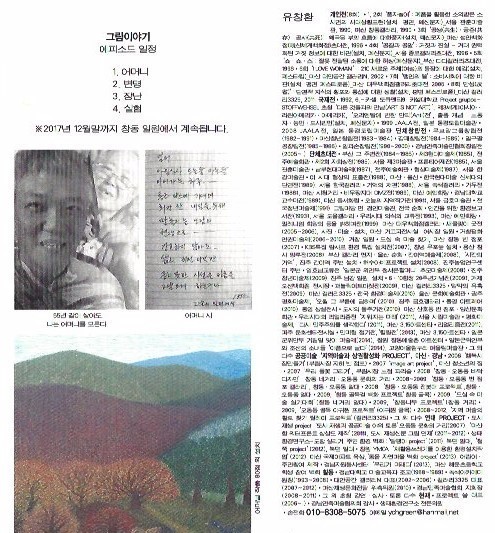유창환
2017 참여작가
약력
-프로젝트 쏠 대표(2006~)
-경남민족미술협의회 감사
-생태환경연구소 전문위원
경남민족미술협회 지회장(2008~2011)
갤러리3325 대표(2007~2012)
마산재생문화전담 위촉위원(2010)
녹색아카데미원장(1993~2008)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1988~1989)
그 외 초청 강연, 심사, 토론 다수
첫 번째 그림이야기 - 어머니
고백
돌아보기_바로보기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소중히 하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미술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그리고, 만들고, 생각한다.
어머님은 노래를 잘하시고, 글도 자주 쓰신다.
어머니께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떄는 15년 전, 작업실에 같이 살게 되면서 부터 인듯하다.
우연히 얻은 한국화 물감을 어머님께 드렸고, 나는 무심히 나의 작업에 전념했다. 그러다 어느 땐가 어머니께서 직접 그린 그림을수줍은 읏 내게 보여 주셨다. 웃음으로 막연히 잘 그리셨다고 대답했던 순간들...
15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께서 틈틈이 그려 놓으신 그림들...
늘 곁에 있으며 무심히 바라보았던 어머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들을 공유하고 싶다.
작가노트 2017.9
두 번째 그림이야기 - 변명
30년 그려봐도 변한 게 없다.
세 번째 그림이야기 - 장난
작가 유창환은 노래를 참 잘한다. 그런데 노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
그는 미술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 거의 무아지경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성이 탈출한 취중에는 자신의 무의식을 한정 없이 쏟아 낸다.
취중이 아닌 경우에도 가끔 발생된다. 유창환의 패악질에 가까운 광기는 그의 따뜻한 성품을 가리며 주변의 오해를 산다. 그래서 유창환은 눈에 보이는 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유창환의 생각 한 조각은 가져가려 한다. 아이러니 하다.
유창환의 옴니버스 전, 세 번째 주제는 ‘장난’이다.
전시된 이미지들의 연출이 그야말로 장난이다. 전시장 한켠에서 그가 도시재생 이미지를 신문에 연재하며 가졌던 꿈에 대한 현재의 허탈함이 고스란히 보여 진다.
온통 구겨진 그의 화면은 ‘그렇게 염원한 최적화된 도시는 절대 꿈’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그 사이를 비집으려 그는 또 다른 장난을 친다. 대담하고 익살스런 표정 이미지와 검열의 수위를 넘나드는 드로잉이 “미술은 재밌다”를 외친다. 그에게 미술은 장난이다. 또, ‘삶’이다.
유창환의 작업은 기호를 생산한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생산해 자신과 현대를 온전히 그려낸다. 때문에 그의 발상 또한 기호에 소급된다. 그의 발상은 그의 입이 쉬지 않고 내뱉는다.
그렇게 표현된 그의 기호는 감상자에게 개별적 의미로 얽혀지며 다양한 스토리로 번역된다.
즉, 그가 내보이는 가벼운듯하나 무거운 화면구성은 하나씩 기호체계다.
그가 미친 듯 회치는 “미술도구!”도 그를 증명하는 기호가 된다.
유창환은 종종 “가난하지만 자족적인 삶을 꿈꾸며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겠노라” 다짐한다. 욕심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그림에서만은 열정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결국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생을 갖겠다는 그다. 그의 기개가 소박하다.
평생 아무것도 소유치 않고 오로지 따뜻한 한자락 햇볕만을 원했던 디오게네스의 의지처럼, 그에게서 햇볕은 마술!이다.
그의 간절한 의지에 물을 주고 싶다. 그에게 함께 물을 주자!
하지만 유창환은 필요 없는 물은 토해내는 나르시스트다!
유창환의 ‘장난’은 모로코 페즈의 미로를 연상시킨다.
벽과 벽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미로를 숨기고 있다는
모로코 페즈의 미로처럼
유창환의 세 번째 스토리는 자신의 드로잉 안에 수많은 미로를 감추고 있다.
미로가 많다는 건 감정의 동선이 난해하다는 거다.
미로가 많기에 유창환의 드로잉에선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는 블랙홀 같은 현실을 장난스럽게 온유한다.
그의 드로잉은 온전히 자신이다. 가볍지만 가볍지 않다.
얇은 종잇장에 불안한 삶에 대한 자기 연민이 넘친다.
작가는 포르노에 가까운 약화를 통해 틀 속에 쟁여진 아폴론적 사유를 디오니소스의 술병 속에 과감히 빠트린다.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현대인들의 얼굴 조각과 닮아 있다.
척박한 생활에서 환상은 공의 동의어다.
유창환은 자신의 환상적 장난을 통해 실상을 유희로 풀어낸다.
포르노와 일상의 간극을 열어젖히며 현실의 암담함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실랄하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 부가된 환상적 실재로서의 도시개발 이미지가 예사롭지 않다.
수년간 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유창환의 의해 그려진 한 도시의 상상도다.
이 또한 그의 장난 속에서 빛을 발한다.
유창환의 "새"가 난다.
유창환의 새는 산 속, 스스로 이름붙인 산의 섬 위를 난다.
새의 날갯짓은 정착도, 유목도 아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 아니다. 허무와 냉소도 이미 없다.
응시와 유한도 잊는다. 부유하는 포말의 이유있음도 아니다.
새는 그냥 흐른다. 물처럼.
뭉클한 가슴이 새를 안게 한다. 안개 같은 연민이 새를 안는다. 마치 그의 모습을 닮았다.
그의 새가 이끄는 시각성은 '푸름'이다.
유상환의 푸름을 따라가면 청년인 그가 있다.
유창환에게 푸름은 '스무살'의 또 다른 형용사다.
그의 스무 살은 파란색이 아니다. 그냥 푸름이다.
굽이굽이 휘모는 산맥에 그의 삶이 그려졌다 지워진다.
심연의 두터운 그리움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향해 있다.
산 그림자처럼 내려앉은 눈물은 푸름 속에 놀고 있다.
볼우물처럼 패인 산기슭에 허기진 승냥이가 연기처럼 서 있다.
푸름 속에 어둠이 베여 있다. 그의 어둠 또한 푸름이다.